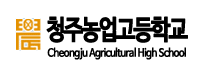|

느티나무는 언제라도 찾아가면 반겨 주고 무슨 말이든 나눌 수 있는 속 깊은 친구 같다. 말을 잘 들어 주는 나무는 속내를 들켜도 좋고, 쭈뼛대며 물러나지 않아서 좋고, 무슨 말인들 거리낄 것이 없고, 낱낱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것 같아서 정이 든다. 쓸쓸한 날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면 늘 그 자리에 있어 위안이 되던 나무, 입맛 다실 무엇이라도 가지고 나와 나누어 먹던 이웃들, 지나가던 누구라도 끼어들어 이야기꽃을 피우던 시절은 기억 속에 아련하지만 느티나무는 제 몸피에다 꼬박꼬박 적어 왔다. 한 그루 나무가 동네 사람 모두의 일기와 같다.
산사나무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에 단단한 의미가 부여되었다. 10여 개의 꽃이 소담하게 모여 피는 것도 손에서 손으로 연결되는 노동의 연결고리 같다. 단결하면 아름답다. 힘이 생기고 의지가 된다. 더 큰 힘을 사용할 용기도 생긴다. 세계의 노동자가 없다면 의식주를 가능하게 하는 가치와 즐거움을 어디에서 가져올 것인가.
지금도 수많은 책과 나무들이 내게 사마라처럼 빙글빙글 돌아가며 새로운 궁금증을 열어 준다. 이미 익힌 즐거움 위에 새로운 즐거움을 얹는 일은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는 나만의 뿌듯하고 확실한 씨앗으로 수확된다. 그리고 점점 더 멀리 확산되고 번지고 날아가 아주 작고 작은 생명체를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연결된다. 흔히 보는 주변의 참새와 노랑나비와 지렁이 한 마리까지, 자연이 일으키는 감각과 활기찬 율동은 만인에게 공개된 비밀이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쁨의 날개인 것이다. 사소한 것, 익숙해서 지나치기 쉬운 나무들의 매력을 문득 찾아내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자주 들판과 골목을 걸어야 하고, 천천히 걸어야 하고, 가만히 보아야 한다. 내가 먼저 나무에게로 가야 한다.
닥나무도 뭔가를 쓰고 싶지 않았을까. 아니, 이미 오래 전부터 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도서관, 서재, 사무실, 공부방 어디라도 책이 없는 곳이 없고, 이는 나무가 쓰고 퍼뜨린 방대한 시간의 기록과도 같다. 지금도 나무는 계속 쓰고 있다. 나무가 지구에 쓰고 있는 글은 깊고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신선하게 새로 곁들이는 것이어서 사람은 일평생 읽어도 겨우 몇 줄이다.
나는 어떤 색일까, 다른 이에게 비춰지는 색은 내가 생각하는 색과는 어떻게 다를까? 수국을 볼 때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어떤 색들을 생각하게 된다. 이해받지 못한 색도 있고 끝내 외면한 색도 있다. 모두가 나를 형성하는 색이지만 어떤 이는 소박하다 하고, 어떤 이는 잘 모르겠다 하고, 어떤 이는 그럴 줄 몰랐다고도 할 것이다. 수국이 환경에 따라 색 반응이 다르듯이 나 역시 만나는 시간과 때에 따라 태도와 표정이 달라진다. 그건 어쩌면 생명이어서, 지고 피고 또 새로운 봄을 맞이해야 하는 생명이어서 그럴 것이다. 생명의 물방울은 하나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로 배합되어 있어 색과 소리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때로는 천진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이 괴팍하고 또 더없이 상냥한 물방울과 같은 색들이 스민다. 지금도 계속 스미고 있다. 한 잎의 물은 나무에게로 가서 크고 탐스러운 꽃이 된다. 한 방울의 나는 다른 사람에게로 가서 작고 더 작은 사람이 된다. 한 나무의 꽃에서 사람의 일생이 피고 지는 것을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