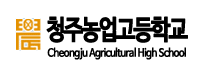‘맛있는 먹이는 못 참아’…기억에 의존하는 미생물의 이유 있는 식탐 |
|||||
|---|---|---|---|---|---|
| 작성자 | 주재석 | 등록일 | 24.06.28 | 조회수 | 4 |
| 첨부파일 |
|
||||
|
21세기를 살아가는 구석기인 식탐, 모든 생물의 중요 생존 본능 인간은 에너지 과잉공급 탓 비만 음식 유혹 못 이겨 건강마저 해쳐
가만히 살펴보면, 다이어트는 운동을 게을리해서가 아니라 음식 조절을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운동 후 샤워를 마치고 개운한 몸과 마음으로 소파에 앉아 마주한 TV 화면에서 흔히 만나는 이른바 ‘먹방’ 프로그램과 그 앞뒤를 장식하는 치킨과 피자, 그리고 음료 광고까지, 누구나 참기 어려운 충동을 느끼기에 십상이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고 딱 오늘 하루만 먹자고 자기 합리화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먹을 것을 놓고 벌이는 본능과 이성의 싸움에서 이성이 이기기가 쉽지 않음을 잘 알 터이다.
진화생물학적으로 보면, 인간이 식욕에 번번이 굴복당하고 마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 현대 생물학에서는 현생 인류의 직계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가 적어도 20만년 전 아프리카에서 출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잘 알려진 대로 인류가 돌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한 시점부터 약 1만년 전까지의 시기를 ‘구석기시대’라고 한다. 구석기인들은 무리 지어 이동하며 채집과 사냥, 즉 수렵 생활을 했다. 자연이 주는 대로 먹고 살았다는 얘기다. 우아하게 말해서 제철 음식을 즐겼다고 볼 수도 있겠다. 아무튼 핵심은 먹거리를 구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따지고 보면, 인간의 삼시 세끼는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 소산이다. 당장 야생으로 눈을 돌려보자. 꼬박꼬박 끼니를 채우는 동물이 어디에 있나? 보통 야생동물은 어쩌다 실컷 먹고, 많은 시간을 배고픔과 싸워야 한다. 구석기인들도 마찬가지였다. 먹거리 확보가 쉽지 않았던 그 시절에는 기회가 있을 때 가능한 한 많이 먹고 여분을 몸에 저장해 두는 게 분명 생존에 유리했을 것이다. 생물학 용어로 표현하면, 영양분이 풍부할 때 이를 최대로 흡수해 지방과 같은 고에너지 분자로 체내에 저장할 수 있게 하는 유전자를 가진 개체가 그렇지 않은 개체보다 굶주림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확률이 높았을 거라는 말이다. 그렇게 늘 배고픔에 시달리던 인류는 불과 100여년 전에야 비로소 기근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물론 세계 곳곳에 여전히 기아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다. 이는 생물학적이라기보다는 정치·사회적으로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다.
아주 간단한 산수를 통해 인류 역사를 축약해 보면, 인류사의 99% 이상이 ‘구석기시대’에 속한다. 그렇다면, 인류는 이 지구에서 사는 내내 배고픔에 허덕이다 아주 최근에 와서야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래서인지 우리 몸이 지금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생물학적으로는 구석기인의 몸을 가지고 21세기의 문화적 삶을 살아가려다 보니 고통과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살과의 전쟁이다.
살이 찌는 근본 이유는 에너지 과잉공급이다. 먹은 밥이 소화되면 주성분인 녹말(전분)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녹아 들어가 각 세포로 공급된다. 허기가 져 머리가 잘 안 돌아갈 때 흔히 당 떨어졌다고 말하곤 하는데, 제법 과학적인 표현이다. 포도당이 가장 중요한 신체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포도당 공급량이 너무 많아 미처 소비하지 못하고 남으면, 그 포도당은 앞으로 닥칠 굶주림에 대비해서 지방으로 바뀌어 저장된다. 먹거리 환경이 풍요로워졌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구석기인의 유전자가 불확실한 미래를 감당하기 위해 내리는 단호한 지령이다. 이런 명령이 반복될수록 살이 오른다. 역설적으로 인류가 힘든 시절을 잘 견뎌내게 한 원초적 본능이 이제는 유감스럽게도 건강을 해치는 식탐에 휘둘리게 하는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
|||||
| 이전글 |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
|---|---|
| 다음글 | 북극에서 얼어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