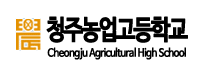산토끼와 집토끼 그리고 옥토끼 |
|||||
|---|---|---|---|---|---|
| 작성자 | 주재석 | 등록일 | 24.10.31 | 조회수 | 7 |
|
현재 우리에게 친숙한 토끼는 크게 두 종류, 가축화된 집토끼와 흔히 산토끼라고 부르는 야생토끼로 나눌 수 있다. 둘은 우선 생김새부터 다르다. 산토끼는 집토끼보다 몸집이 크고 귀도 길다. 갓 난 토끼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극명하다. 집토끼는 털이 없고 눈도 뜨지 못한 상태로 태어나지만, 산토끼 새끼는 온전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와 바로 눈을 뜨고 당장이라도 달릴 준비가 되어 있다. 사실을 말하자면, 집토끼와 산토끼는 ‘종(species)’을 넘어 ‘속(genus)’이 다르다. 무엇보다도 염색체 수가 집토끼는 22쌍, 산토끼는 24쌍이다. 이 정도면 둘은 양과 염소만큼이나 다른 셈이다.
오늘날 전 세계에 사는 집토끼는 모두 한 조상, ‘유럽토끼(학명 Oryctolagus cuniculus)’의 후예다. 토끼 사냥은 적어도 12만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고기와 모피를 더 많이 안정적으로 얻기 위해 인류는 마침내 토끼 가축화에 성공했다. 이베리아반도 들판에서 굴을 파고 살던 야생토끼가 인간 손에 길들여져 집토끼가 된 데에는 생물학적으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집토끼는 산토끼보다 달리기가 느린 데다, 멀리 도망가기보다는 가까운 굴에 숨으려고 달음박질치다 보니 상대적으로 쉽게 잡힌다. 게다가 무리를 지어 사는 집토끼는 사회성이 좋아서 가축화가 그만큼 쉬웠을 것 같다. 오늘날 집토끼는 다양한 품종으로 개량되어 가축을 넘어 반려동물로 사랑받기도 하고, 의생명과학 연구의 귀중한 모델 생물로서 인류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집토끼와는 대조적으로 가축화된 산토끼는 아직도 없다. 일단 산토끼는 위협을 감지하면 탁월한 뜀박질 실력을 뽐내며 순식간에 멀리 달아나 버린다. 산토끼는 시속 70㎞까지 달릴 수 있다. 집토끼보다 거의 두 배쯤 빠른 속도인데, 1초에 자기 몸길이의 37배를 주파하는 셈이다. 가장 빠른 육상동물로 알려진 치타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27배에 그친다. 이런 날쌘돌이를 힘들여 잡아도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힌다. ‘나 혼자 넘어서’라는 ‘산토끼’ 노랫말대로 단독 생활형인 산토끼는 사회성이 없어서 사람에게 호락호락 넘어오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에 갇힌 산토끼는 매우 불안해하며 작은 자극에도 겁을 먹고 날뛰는데, 심하면 우리에 부딪쳐 죽을 정도라고 한다. 여기서 ‘경솔한’ 또는 ‘무모한’을 뜻하는 영어 형용사 ‘헤어브레인드(harebrained)’가 유래한 듯하다. 참고로 집토끼와 산토끼를 가리키는 영어는 각각 ‘래빗(rabbit)’과 ‘헤어(hare)’이다. 말이 나온 김에 산토끼와 관련된 영어 표현을 하나 더 소개한다.
‘완전히 미친’ 또는 ‘몹시 화난’을 뜻하는 ‘mad as a March hare’라는 숙어는 아무래도 산토끼의 짝짓기 행동을 보고 만든 것 같다. 짝짓기에 앞서 암컷 산토끼는 냅다 내달린다. 수컷의 달리기 능력을 시험해 보기 위함이다. 한동안 펼쳐지는 추격전에서 자기를 잡는 수컷만 배우자로 받아들인다. 따지고 보면, 포식자가 득실거리는 야생 환경에서 달리기는 산토끼 생존을 담보하는 최고의 기술이다. 이런 맥락에서 수컷 산토끼의 질주 본능을 자극하는 암컷의 속내는 오랜 진화의 산물이라 하겠다.
생물학적으로 말해서 모든 생명체는 생존을 위해 먹고, 번식을 위해 생존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암컷을 따라잡지 못하면 수컷 산토끼는 존재 가치를 송두리째 잃고 마는 처지가 된다. 토끼는 일 년 내내 번식이 가능하지만, 봄이 시작하는 3월에는 더욱 발정할 터이다. 시쳇말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식으로 뛸 수밖에 없다. 비장하다 못해 처절한 속내를 모르는 무심한 사람 눈에는 괜한 발광으로 보이겠지만 말이다.
|
|||||
| 이전글 | 곤충은 남의 밥상을 넘보지 않는다 |
|---|---|
| 다음글 | 먼지 |